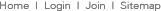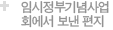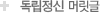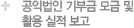독립운동의 처음과 끝은 통합이었다.
‘3·1혁명’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본격화한 독립운동은 느리지만 꾸준히 통합을 향해 나아갔다.
때로는 이념과 주도권 다툼으로 분열도 했지만, 독립운동 과정 자체가 좌우통합을 향한 긴 노력의 여정이었다. 좌우가 손잡지 않는다면 독립은 요원하다는 목소리들 때문이다. 임시정부 대통령과 총리를 지낸 박은식은 1925년 임종을 앞두고 “독립운동을 목표로 세운 이상 환경을 묻지 말고 다 함께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노력 끝에 1940년대 초 좌파 성향 민족혁명당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임시정부는 부분적이나마 좌우연립 형태로 광복을 맞이했다.
임시정부의 시작은 좌우통합이었다. 상해임시정부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수립 직후부터 통합을 시도했다.
같은 해 11월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을, 좌익 진영을 대표한 이동휘가 국무총리를 맡으며 사실상 최초의 좌우합작이 성사됐다.
그러나 이동휘가 1921년 1월 사임하면서 통합 임시정부는 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동휘와 이승만 간 갈등이 심했고 임시정부는 분열했다.
통합 임시정부 와해 후 혼란 극복을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열렸다.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 독립운동기구 창설을 요구한 ‘창조파’와 임시정부 정통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개조파’ 간 대립이 이어졌다. 회의는 끝내 결렬됐다.
좌우통합운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1920년대 중후반 중국에서 민족유일당 운동과 국내에서 신간회 운동이 이어졌다. 1930년대에는 대일전선통일동맹과 좌우통합의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다. 1939년에는 좌우 각 조직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7당·5당 통일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좌초했다.
“나의 가진 주의가 무엇인지 나도 무엇이라고 이름지을 수 없습니다. 민족주의도 아니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 우리 민족을 압박하는 일본을 대항하며 나아가자는 민족적 현상을 절규함에는 자기의 주의가 무엇이든지 같은 소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사람이면 어떤 주의, 주장을 물론하고 이 민족 혁명에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 임시정부의 처음과 끝 모두 ‘좌우통합’이었다
<1부> 우리는 독립운동가입니다 ⑦ 우리가 몰랐던 임시정부의 ‘두 날개’
앞서 도산 안창호는 1926년 상해에서 이같이 연설했지만, 분열의 원심력을 이기기는 어려웠다. 좌우파의 대립은 물론 우파는 우파 안에서, 좌파는 좌파 안에서 갈등했다. 출신 지역에 따른 반목도 있었다.
그러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통합의 의지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구와 김원봉은 1939년 각 진영을 대표해 “주의와 사상이 같지 않아도 동일한 적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과 좌파 진영의 조선의용대가 일부 통합했다. 1944년 임시정부 좌우 연립내각이 출범한 것도 합작을 위해 부단히 애썼던 지난날의 분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좌파 진영의 또 다른 세력인 조선독립동맹과 임시정부를 연계하려는 노력도 광복 직전까지 이어졌다.
독립운동 진영의 좌우통합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는 해방 후의 좌우 ‘이념 갈등’으로 이어졌다. 1948년 분단 이후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은 참혹했다. 민족상잔의 전쟁 참화도 겪었다. 그러나 평화와 화해, 소통의 움직임은 대립과 갈등에 짓눌리면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통합은 지금의 과제로 남아 있다. 3·1운동 100년, 임시정부부터 공화국 100년의 못다 한 ‘통합의 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