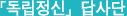< 무너진 청산리전투 기념비, 잡초만 무성한 대종교 삼종사 무덤…. 중국 내 항일투쟁 유적지는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광복 62주년을 맞아 중국 만주 지역에 위치한 항일운동 거점을 찾았다. 이번 답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진행된 답사에는 경향신문 취재팀 외에 대학생·교수 등이 동행했다.>
대리석 일부가 떨어져나가 흉물스러운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
지난달 26일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의 청산리 입구. 큰 기념비가 눈에 들어왔다. 1920년 10월의 청산리 전투를 기리기 위한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였다. 이 기념비는 2001년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수건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건립했다. 예산만 3억5000만원이 투입된 대공사였다. 그러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 기념비를 마주한 순간 동행한 대학생들과 교수들의 입에서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安의사 저격지점 지나칠 판건립된 지 불과 6년 만에 기념비는 황폐화돼 독립유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의 윗부분은 떨어져 나갔다. 그나마 남은 부분도 갈라지고, 깨져 있었다. 주변에는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표지까지 서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최고 성과로 꼽히는 청산리전투의 기념비는 무관심 속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다. 관심을 기울이고, 가꾸고, 돌보지 않는 역사는 우리 역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했다.
김영광 청산리대첩기념비건립추진위원장은 애초 기념비 건립공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혹한기를 감안하지 않고 시멘트를 바른 것이 온도 차이로 인해 파손됐다는 것이다. 기념비 관리를 약속했던 허룽시의 관리 부실도 한몫 했다.
답사단 김동현씨(28·대학생)는 “기념비를 보면서 청산리 대첩의 정신을 되새기고 싶었는데, 훼손된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반병률 교수(국사학)는 “청산리 전투는 항일 무장투쟁의 시 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전투”라면서 “조선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념비 철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념비의 비문도 바뀌었다. 처음엔 옌볜지역 ‘조선족’이 건립했다고 표시돼 있었지만 ‘각 민족’으로 슬그머니 바뀌어져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어느새 이곳까지 침투한 것이다.
황량한 기념비 옆으론 백두산 아래 이도백하에서부터 허룽, 룽징(龍井)에 이르는 중국의 변경지방을 개발하기 위한 고속도로 교각 건설작업이 한창이었다.
황폐해진 것은 청산리 기념비뿐만이 아니었다. 나철, 서일, 김교헌의 묘를 모신 허룽시의 대종교 삼종사묘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무덤의 주인을 알리는 표시조차 없었다. 잡초 사이로 봉분의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으려는 듯 세개의 무덤이 낡은 천조각으로 덮여진 채 방치돼 있었다.
中·韓 유적관리 하늘과 땅국학학술원 김호일 원장은 “광복을 향한 선조들의 열정이 담긴 유적지 곳곳이 방치된 것을 보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같은 항일투쟁가라도 중국인과 한국인의 유적지 관리 실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컸다. 1930년대 중국 공산당원으로 동북 항일연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했던 양정우의 경우에는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관 등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같은 1930년대 조선혁명군 소속 한·중연합군으로 항일 전쟁에 나선 ‘조선인’ 양세봉 장군의 경우 신빈현 왕청문의 한 농가 옆 살해당한 자리에 덩그러니 흉상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中·한국인 유적지 관리 하늘과 땅-
잡초가 무성한 채 낡은 천조각으로 덮여 있는 대종교 삼종사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하얼빈역을 찾은 건 24일. 그러나 그곳에는 역사적 사건 현장을 알리는 흔한 안내판 하나 없었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서야 역구내 바닥에 붉은 타일로 표시된 곳이 저격지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호일 원장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고 관리사무소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